| J Korean Dent Assoc > Volume 63(8); 2025 > Article |
|
Abstract
Purpose
Methods
Results
Figure 2.

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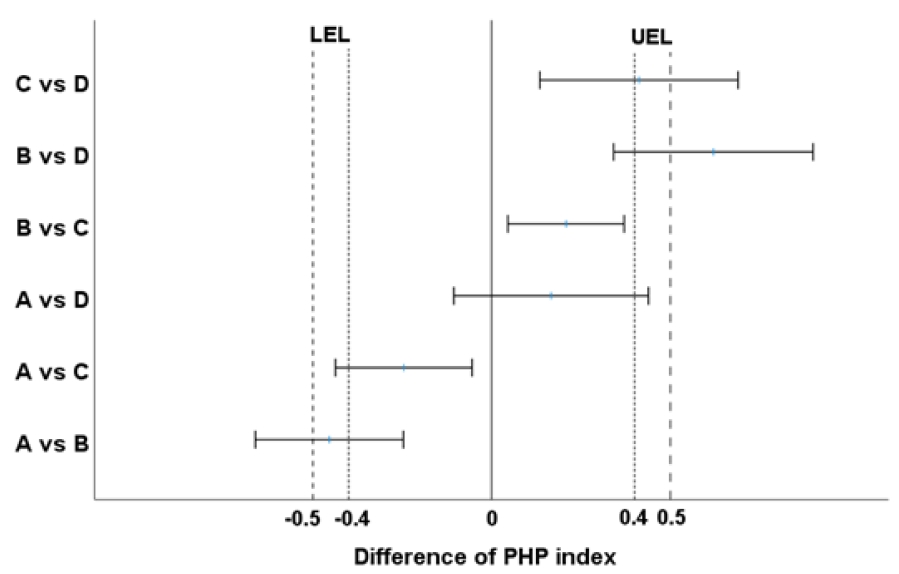
Table 2.
| Disclosing solution | Last time brushing teeth | P value |
|---|---|---|
| HellotisTM | 7.50 ± 3.24 | >0.05 |
| TraceTM | 7.85 ± 3.28 | |
| 2-ToneTM | 7.60 ± 3.13 | |
| 2-Tone Tablet | 7.90 ± 3.30 | |
| Total | 7.71 ± 3.21 |
Table 3.
Table 4.
Table 5.
| PDAs | After staining | After brushing | P value* | Staining removal rate |
|---|---|---|---|---|
| HellotisTM | 2.26±0.77ab | 0.03±0.08a | <0.05 | 98.57±3.40 |
| TraceTM | 2.71±0.66a | 0.11±0.19b | <0.05 | 96.52±5.77 |
| 2-ToneTM | 2.50±0.79ab | 0.05±0.12ab | <0.05 | 97.86±4.61 |
| 2-Tone Tablet | 2.09±0.91b | 0.03±0.08a | <0.05 | 98.63±3.47 |
| Total | 2.39±0.82 | 0.06±0.13 | <0.05 | 97.90±4.46 |
| P value† | <0.05 | <0.05 | >0.05 |
REFERENCES
-
METRICS

-
- 0 Crossref
- 0 Scopus
- 138 View
- 4 Download
- ORCID iDs
-
You-Jin Cho

https://orcid.org/0009-0004-9484-3830Eun-Joo Jun

https://orcid.org/0000-0003-1604-8618Min-Ji Byon

https://orcid.org/0000-0003-0359-9234Seung-Hwa Jeong

https://orcid.org/0000-0001-5173-2859 - Related articles
-
A simple colorimetric method for the clinical evaluation of caries activity in adults2017 June;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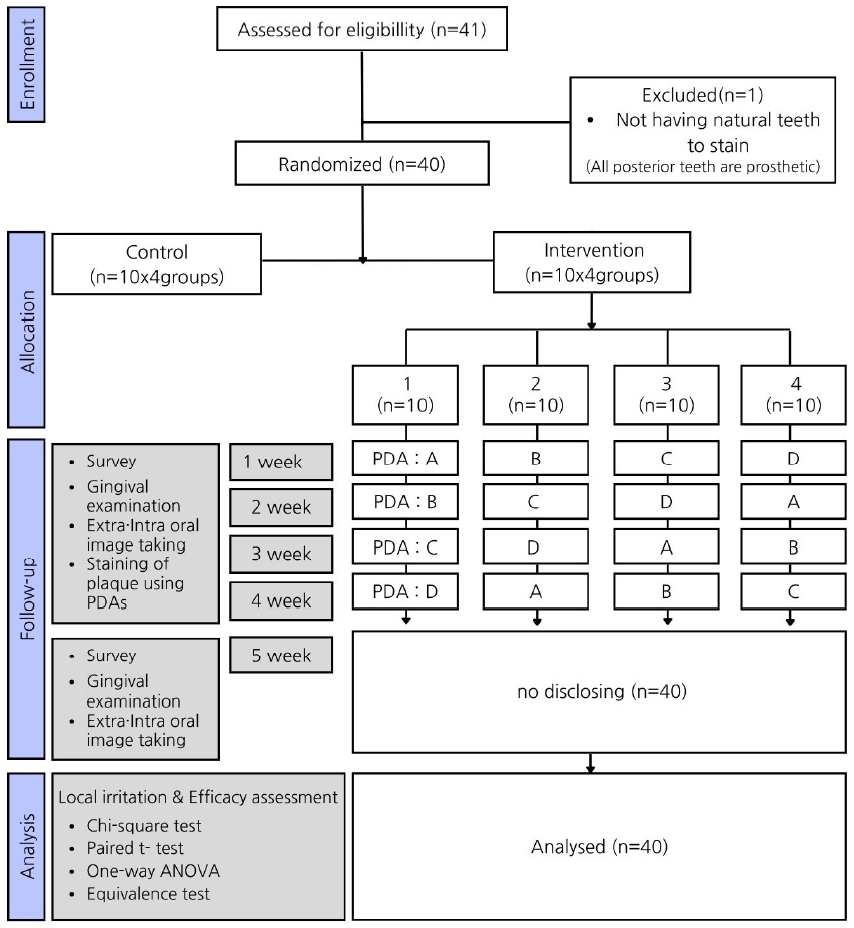

 PDF Links
PDF Links PubReader
PubReader ePub Link
ePub Link Full text via DOI
Full text via DOI Download Citation
Download Citation Print
Pr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