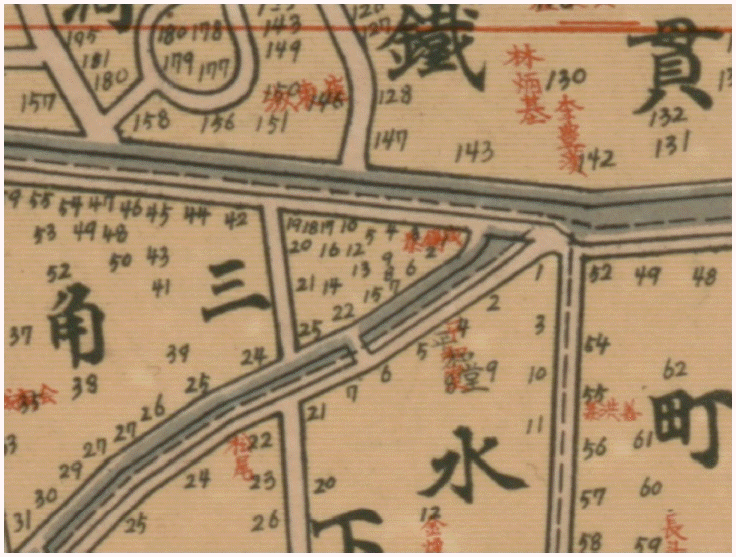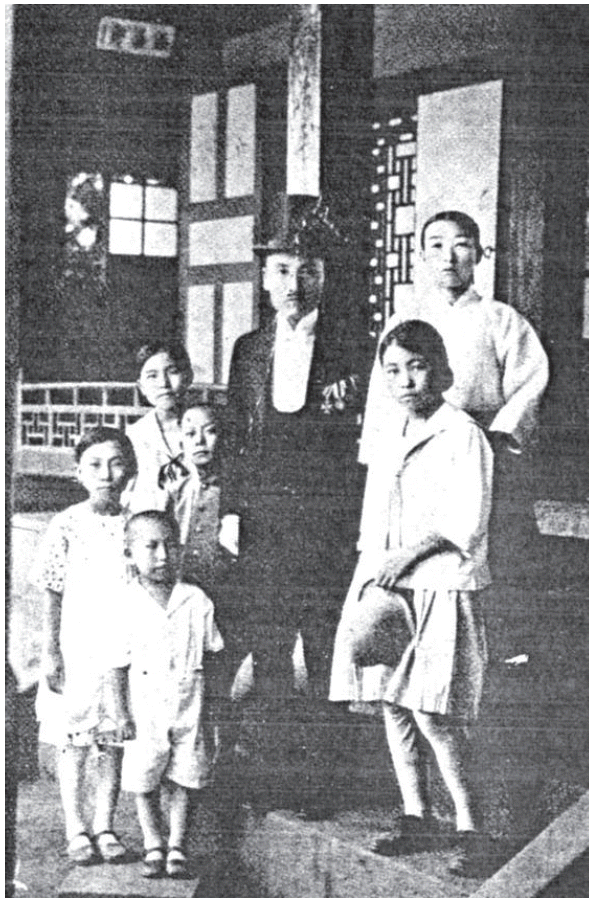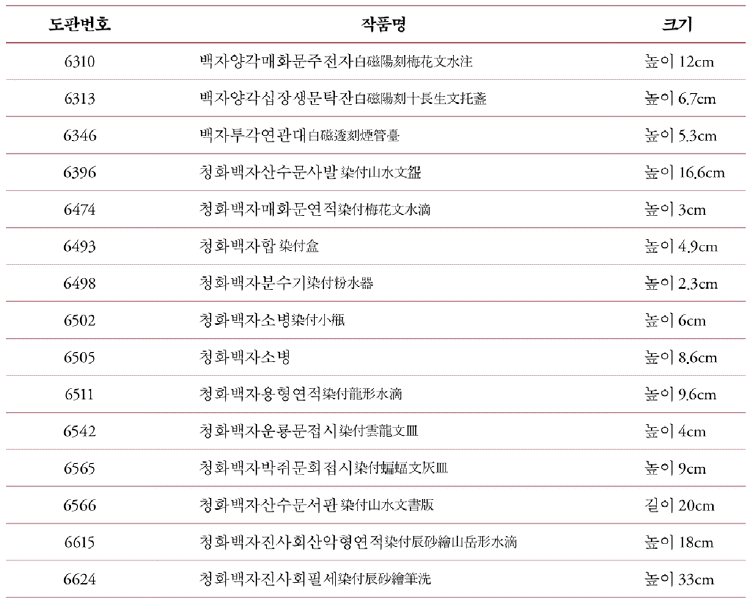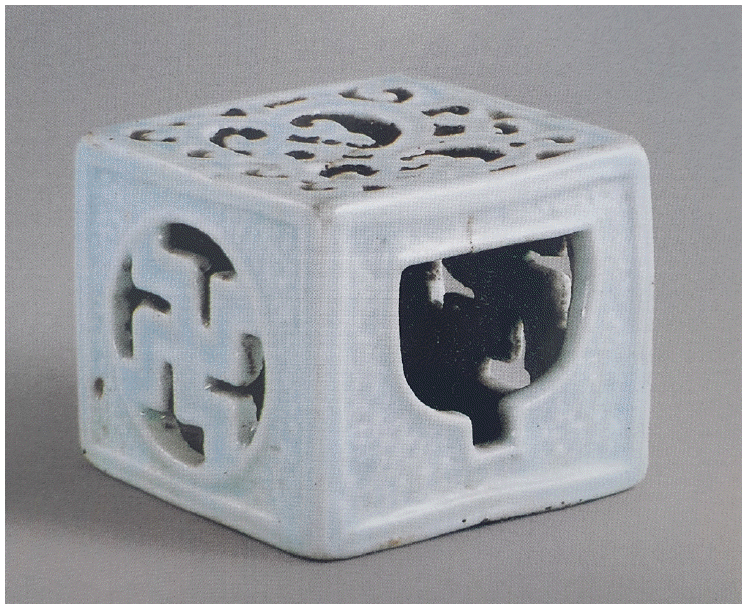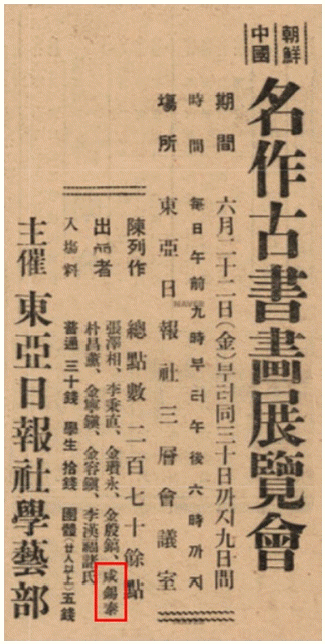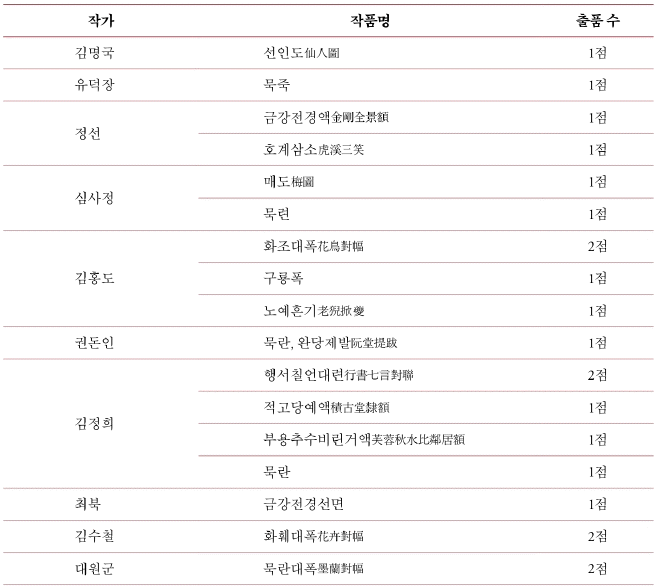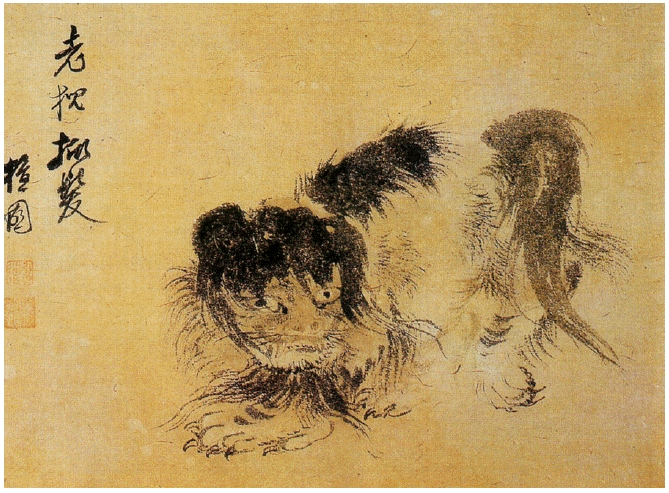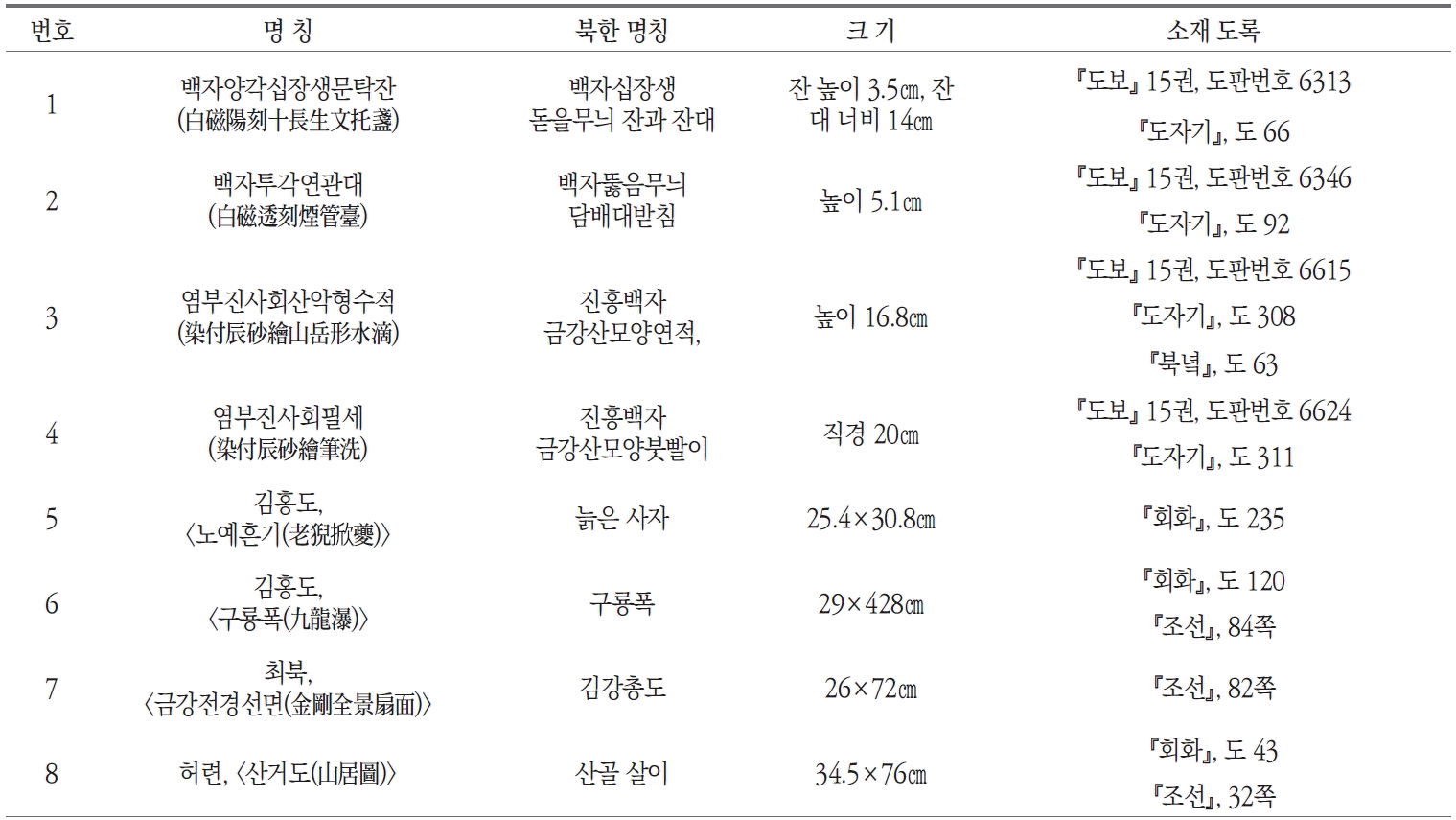일제강점기 고미술품 수장가 치과의사 함석태
Ham Seok-tae collection of Korean artifacts during Japanese occupation
-
Sangyeop Kim*

- ABSTRACT
-
Dentist Seok-tae Ham was one of the leading collectors of Korean ancient ar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ossessing thousands of such artifacts. According to newspaper records, he participated in seven exhibitions, loaning some 32 works of calligraphy, paintings by 14 Korean artists, and the Joseon Dynasty Ceramics Collection Volume 15, which contained photographs and descriptions of his 15-piece celadon and blue-and-white porcelain collection. Although these are only a part of his overall collection, Seoktae Ham's outstanding knowledge and aesthetic sense of Korean antiquities can be sufficiently observed by his collection choices. This collection can be considered a national treasure as he was especially fascinated by the aesthetics of ancient items, particularly small items and art pieces of unusual shape. Seoktae Ham’s collection of ancient art pieces was chosen not for economic reasons, but for their immense cultural value.
- 함석태(咸錫泰: 1889~?)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정규교육을 받은 후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이자 최초의 치과 개원의이다. 평안북도 영변의 부유한 집안 출신인 함석태는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현 일본 치과대학)를 1912년에 졸업하고 1913년 말까지 도쿄에 머문 후 귀국했고, 1914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치과의사면허를 받은 후 치과의사면허 제1호로 등록되었다. 함석태가 당시로서는 생경한 학문 분야인 치과의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유복했던 가정환경과 사회사업에 힘쓰는 등 ‘개화(開化)’한 집안이었기에 선진 학문 분야를 습득하는 데 큰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함석태의 손자 함각(咸珏)은 자신의 집안과 가세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1].“대단한 부호였음에 틀림없다. 소작을 주는 전토도 많아서 고향에서는 남의 땅을 밟지 않고 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증조부 함 진사(함영택)는 재산이 많은 만큼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등 소위 ‘사회사업’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다. 조부 함석태 선생이 일본에 유학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한편 독립운동가이자 종교인·시민사회운동가인 함석헌(咸錫憲: 1901-1989) 선생의 만년을 모신 서지학자 김영복 문우서림 대표는, “함석헌 선생께서 강의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함석태라는 분이 계시는데 골동품을 많이 모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회고했다(2025.5.14.). 함석헌은 함경북도 용천 출신이었고 부친 함형택은 한의사였던 것을 보면, 지역과 성명 등의 측면에서 함석태 일가와의 가계적 연결도 미루어 짐작되는 일면이 있다.1914년 6월 19일경 경성 삼각정 1번지 부근 옛 제창국(濟蒼局) 자리 동쪽에 함석태 치과의원을 신축한 후 개업했다(Fig. 1). 함석태는 1919년 이후 일본에 유학했던 다른 치과의사들이 귀국하여 개업하기까지, 일본인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조선은 그의 ‘독무대’였다(참2). 그는 보철 등 치과 일반을 보면서 구강외과에 주력하다 1925년에 경성치과의학교에서 첫 졸업생이 배출되자 우리나라 치과의사 7명을 규합하여 한성치과의사회를 설립,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일본인과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선치과의사회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소외되자 우리나라 사람만의 치과의사회를 조직한 것인데, 이러한 경향도 그의 민족의식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함석태는 충치 예방 등에 관한 글을 ‘동아일보’에 기고하고, 치아 위생에 관한 좌담회 등에 참여하는 등 특히 구강위생 계몽 활동에 힘을 쏟았다[2]. 일제강점기 당시 치과의사로서 함석태의 위상은 도산 안창호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인 김약수(金若水: 1893-1964) 등의 치과 치료를 했다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3,4]. 함석태는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의사로서만 유명했던 게 아니고 조선총독부가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사였음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1936년 경성일보사에서 펴낸 ‘대경성공직자명감(大京城公職者名鑑)’은 당시 47세인 함석태에 대한 기본적 자료와 취미 사항, 인물평 등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 특히 그의 취미와 특기가 “서화, 분재, 여행, 하이쿠(俳句), 골동, 꽃꽂이, 특히 전다(煎茶)를 좋아함”이라 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성향이 다분히 일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5]. 한편 1919년 9월 2일 오후 5시 남대문역(서울역)에서 사이토 미노루(齋藤實) 총독을 저격했던 강우규(姜宇奎: 1855-1920)의사의 어린 손녀 강영재를 함석태가 맡아 키워 이화여전까지 졸업시켰다는 사실을 특기할 만하다(Fig. 2). 이 사실은 한성치과의사회를 설립한 것과 함께 그의 민족의식의 일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예로 여겨진다. 또한 그는 1930년 5월 19일 사회장으로 치러진 남강(南崗) 이승훈의 장례식에 부의금 5원을 쾌척했고, 1943년 11월 7일에 박흥식, 예종석, 윤치호, 한상룡 등 총 90여 명과 함께 서울 YMCA에서 학병제 경성익찬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참여했다.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일본 유학까지 마쳤으나 그는 총독 암살을 시도한 민족운동가의 손녀를 거두어 키우고, 우리나라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치과의사협회를 조직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일본식 생활풍습과 취미를 가졌으며, 학병 모집에 참여하는 등 일제의 시책에 충실히 협조하며 살아갔다. 함석태의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듯한 삶의 양태는 친일이나 극일이라는 이분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혼란스러운 삶의 단면이 아닐까 싶다.
- ‘소물진품대왕(小物珍品大王)’ 함석태의 미술품 수집 성향
- ‘소물진품대왕(小物珍品大王)’ 함석태의 미술품 수집 성향
의사학(醫史學) 연구자들은 함석태의 고미술품 수집을 강우규 의사의 손녀를 거두어 키운 것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일면이라는 우호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는 일제강점기 주요 수장가의 한 사람으로 꼽힐 만큼 우수한 고미술품을 많이 소장했던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가 그처럼 고미술품을 수장하게 된 동기는 분명하지 않다. 함석태는 앞에서 보았듯이 서화, 골동 외에도 하이쿠, 분재, 꽃꽂이, 전다 등 일본적 취미를 가졌는데 이런 유의 취미가 고미술품 수장 활동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6].함석태의 고미술품 수장 활동에 대해서는 그와 교류했던 인사들, 특히 그가 드나들었던 장택상(張澤相)의 집에서 이루어진 모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모임은 당대 최고의 수집가들로 이루어진 동호인 그룹으로, 일종의 ‘살롱’이라 할 수 있는 장택상의 집에 출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고미술품에 대한 그의 열정과 감식안을 보증하는 예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초반, 장택상의 집에서 이루어진 모임은 우리 근대 고미술품 소장과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33년 장택상이 대구에서 경성 한복판 수표동으로 이사한 후 그의 집은 고미술품 수장가들과 호사가들의 주요한 모임 장소가 되었다. 당대의 부호이자 탁월한 국제 감각, 능란한 외교력, 뛰어난 감상안을 갖춘 장택상의 집은 동호인들의 일종의 공동 회합 장소였다. 당시 장택상의 사랑방에 모이던 고미술품 수집가들은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윤치영(1898-1996), 치과의사 함석태, 한성은행 두취(은행장)를 지낸 한상룡의 동생인 서화 수집가 한상억, 서화가 이한복, 배화여중 교장을 지낸 이만규(1882-1978), 화가 도상봉(1902-1977)과 이여성, 서예가 손재형, 의사 박병래 등이었다.함석태는 문학가로 유명한 상허(尙虛) 이태준(李泰俊)과도 교유하는 등 당시 경성의 명사 가운데 하나였다[7]. 백자 수집가로 유명한 박병래는 “함 씨는 그 열성이 하도 대단해서 심지어 기인(奇人) 소리를 들을 정도의 일화를 남긴 분”이라고 기억할 정도로 함석태의 고미술품에 대한 집착과 애정은 컸다. 박병래는 함석태가 “성품이 온아하고 다감한 인정을 가진 분”으로 언급하고, “그는 실로 감읍할 정도로 골동에 애착을 가졌던 분(경제적 타산과 관계없이) 함 씨가 골동에 들인 정성은 정혼을 기울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 저녁 신들인 사람처럼 골동을 부비며 애완하는 모습은 일견 사기 그릇의 반질반질한 멧물釉藥의 표면을 뚫고 왕래하는 전신의 소작인 것 같기도 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8]. 또 함석태는 “특히 작은 물건을 좋아해서 도자기로 만든 바늘통이며 담배물부리 같은 것을 잔뜩 사 모았”고, 박병래의 아버지가 “한번은 함석태 씨를 보고 ‘함 선생, 골동을 하면 망한다는데 어떻소’하고 물으니까 함씨가 ‘그야 서화를 하면 망한다지만 골동은 안그래요’라고 대답했다”고 전한다. 이 일화를 통해 함석태가 서화보다는 도자기 등 공예품을 많이 수집한 연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8]. 박병래도 그의 조언으로 가짜를 판명한 적이 있을 정도로 함석태의 감식안은 탁월했다.함석태의 고미술품 수집에 대한 화상(畵商) 오봉빈의 ‘소물진품대왕’이라는 유머러스한 평이야말로 그의 치밀한 성품과 소장품의 성향에 대한 정확한 표현으로 여겨진다. 오봉빈은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미술기획자로 조선미술관을 경영했다.토선(土禪) 함석태씨야말로 모든 일을 샐 틈 없게 하는 이다. 소 털을 쏟아서 제 구멍에 쏟는 이가 있다면 아마 함씨라 할 것이다. 이가 모은 서화 골동 전부가 다 기기묘묘하고도 모두가 실적인 물건뿐이다. 이모저모로 보아도 좋은 물건뿐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무호 이한복씨 수장품은 함씨가 유사할 것이 있다. 요모조모로 이 기기묘묘하며 소품이면서도 대물 거품을 능가할 만한 - 간단히 말하면 조선에서는 소물진품대왕이라[9].사학자 손진태가 1935년 8월 1일에 발간된 잡지 ‘삼천리’ 제7권 제7호에 쓴 ‘문예(文藝) 민예수록(民藝隨錄)’에 “삼각정 함석태씨가 민예품 중에도 특히 목공품을 수집하신다는 말을 위창(오세창) 선생으로부터 듣고 한 번 찾아갔으나 불행히 만나지 못했다”고 한 것을 보면 함석태의 고미술품 수집 취미는 당시 경성의 식자층 사이에서 익히 알려졌던 것으로 여겨진다[10]. 함석태는 고미술품 수집에 대한 몇 가지 일화를 갖고 있다. 이 일화들은 그의 고미술품에 대한 애착과 함께 당시의 시대상과 수집 방식 등의 일면을 알 수 있게 해준다[8].함석태는 금강산 연적을 지극히 아껴 꼭 싸가지고 다니다가 일본에 갈 때도 반드시 휴대하고 다녔다. 부산에서 연락선을 탈 때 일본 형사에 의해 추궁을 당했지만 여러 번 왕래하는 동안에 소문이 나서 금강산 연적만은 검사를 받지 않을 정도로 잘 알려지게 되었다.어느 날 원남동 부근을 거닐던 함석태는 달구지에 실린 이삿짐 끝에 메어 달린 옛날 장롱을 보고 달구지가 들어가는 집을 끝까지 쫓아갔다. 그는 목공예에도 상당한 식견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장을 골동을 넣어두는 장으로 쓸 심산이었다. 장롱의 주인이 쌀가게를 차리자 매일 꼰 한 되씩 쌀을 사던 함석태는 그를 미심쩍게 여기는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 장롱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다. 절대로 안 된다고 우기는 주인에게 미쓰코시 백화점의 신식 양복장을 사다 주고 얻어왔다.이밖에 서울 광화문 네거리 동북부에 있는 비각(碑閣)의 철제문도 함석태가 보관했었다. 비각의 원래 이름은 ‘대한제국대황제보령망육순어극사십년칭경기념비각(大韓帝國大皇帝寶齡望六旬御極四十年稱慶紀念碑閣)’이다. 이 비는 대한제국의 대황제 곧 고종황제의 연세가 육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왕위에 오른지 40년이 되는 경사를 기념해서 1902년(광무6)에 세운 비이다. 이태준의 표현에 따르면 이 비각의 문짝을 “길을 넓히느라고 뜯어 경매할 제” 함석태가 경매로 낙찰 받는 것으로 “진고개 부호가 거액으로 탐내왔으나 굳게 보관해온 것”이다[8].이처럼 열성스럽게 고미술품을 수집하던 함석태는 광복 직전 일제 의한 소개령에 의해 1944년 9월 또는 10월경 고미술품을 모두 추려 가지고 고향인 평안북도 영변으로 피신했다. 광복 이후 그는 맏손자 함완에게 황해도 해주에 들러 먼저 월남하겠으니 뒤따라 올 것을 부탁하고 부인 딸을 데리고 먼저 길을 떠났지만 이후의 소식은 알 수 없다. 그가 해주를 월남 루트로 택한 것은 배에 가족과 고미술품을 함께 실어 월남하려 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1].
- 함석태의 수장품
- 함석태의 수장품
함석태가 소장했던 고미술품의 수효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제의 소개령에 따라 고미술품을 “세 차나 싣고 왔다”는 손자 함각의 전언을 통해 대단한 수효였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935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권 15 ‘조선 시대 도자 편’에 함석태의 자기류 품의 일부가 실려 있는데 나가타 에이조(永田英三, 22점), 마쓰바라 준이치(松原純一, 21점), 다나카 아키라(田中明, 18점)에 이어 그의 소장품이 15점으로 네 번째로 많이 수록된 것을 보면 함석태가 당시 조선백자 수장가로서 손꼽히는 인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고적도보’ 권 15 ‘조선시대 도자 편’에 수록된 함석태의 소장품은 표1과 같다(Fig. 3). 책에 수록된 순서를 따랐다.함석태가 소장했던 조선백자들은 “특히 작은 물건을 좋아해서 (도자기로 만든) 바늘통이며 담배물부리 같은 것을 잔뜩 사모았다”는 박병래의 평과 ‘소물진품대왕’이라는 오봉빈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작고도 모양이 독특한 자기들이 대부분이다. “소 털을 쏟아서 제 구멍에 쏟는 이”라는 오봉빈의 평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성품이 대단히 치밀하고 꼼꼼했기 때문에 작은 물건에 애착을 가진 듯도 하다.번호 6346 <백자투각연대>는 높이 5.3센티미터가 채 되지 않는 작은 담뱃대받침으로서 ‘작은 물건을 좋아한’ 그의 골동 수집 취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Fig. 4). 번호 6615 <청화백자진사회산악형연적>은 북한의 국보로서 2006년 6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북녁의 문화재’ 전시회에 <백자 금강산 연적>이라는 이름으로 출품되었는데(Fig. 5), 북한 도록류에서의 명칭은 <진홍백자 금강산모양연적>이다. 이 연적이 함석태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금강산 연적’으로 추정되는데, 험준한 봉우리를 첩첩이 만들고 계곡 곳곳에 사람과 동물, 정상에는 다층 누각집을 배치했고 화려한 채색안료를 사용하여 장식성을 한껏 발휘했다. 굵은 음각선을 새겨 바위산의 질감을 강조한 이 연적은 코발트와 구리 안료를 채색하여 청홍(靑紅)의 변화를 화려하게 강조했고, 굽에 ‘병오(丙午, 1846)라는 간지(干支)가 있어 그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11].이외에도 북한 문화재를 수록한 도록의 사진을 통해 함석태가 수장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 번호 6624 <청화백자진사회필세>는 북한에서는 <진홍백자금강산모양붓빨이>로 부르는데 역시 금강산을 상징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며 가운데에 우뚝 솟은 바위산을 중심으로 청화(靑華)와 진사(辰砂)로 채색된 다양한 모습의 산들을 배치하여 변화감을 주었다(Fig. 6). 북한은 이 작품에 대해 “어느 모로 보나 당대의 ‘붓빨이’를 대표하는 걸작품의 하나”라고 해설했는데 그 말에 공감할 수 있게 작품이다[12].이처럼 함석태는 도자기와 민속품을 주로 수집한 수장가이지만 그의 서화 소장품도 일제강점기 주요 수장가의 반열에 들 정도였음을 1930년대에 개최된 여러 전람회에 출품한 그의 소장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1930년 10월 17일에서 2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오봉빈의 조선미술관 주최로 동아일보사 3층 홀에서 개최된 제1회 조선고서화진장품전람회에 함석태는 “최북의 <금강총도(金剛摠圖)>, 추사의 <예서십폭병>, 석파 대원군 <난>, 단원의 <동물>” 등 4점을 출품했다[13]. 또한 1932년 10월 1일에서 5일까지 5일간 역시 조선미술관 주최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제2회 조선고서화진장품전람회에는 “단원 김홍도의 <구룡폭>, 소치 허련의 <산거도(山居圖)>, 북산 김수철의 <선면매죽(扇面梅竹)> 등 3점을 출품했다[14]. 아울러 1934년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동아일보사 주최로 동아일보사 3층에서 열린 ‘조선중국명작고서화전람회에는 장택상, 이병직, 김찬영, 김은호(1892-1979), 박창훈, 김영진, 김용진, 이한복 등 당대의 주요한 수장가들과 함께 출품을 했는데 이 전람회에 그가 출품한 작품 수는 모두 10인의 작품 20점이었다(Fig. 7,8).북한에서는 ’늙은 사자‘라고 불리는 김홍도의 ’노예흔기(老猊掀夔)‘는 일어서려는 늙은 사자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배경을 생략하고 그리는데 대상만을 포착해 그린 것은 김홍도의 풍속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다(Fig. 9). 능숙한 솜씨로 붓의 강약과 먹의 농담을 조절하여 사자의 잠재된 운동감을 느끼게 하는 등 대가다운 솜씨를 발휘한 수작이다. 김홍도 특유의 활달한 붓놀림이 인상적이다. 근대의 화가이자 미술이론가인 근원 김용준이 1948년에 간행한 근원수필에서 함석태 소장 최북의 금강산선면을 언급한 바 있는데(Fig. 10) [5], 김용준이 언급한 작품이 조선중국명작고서화전람회에 함석태가 출품한 소장품이자 현재 평양의 조선 미술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금강전경선면‘으로 추정된다. 최북의 작품 가운에 부채에 그려진 금강산 그림은 오직 이 작품만 알려져 있는데, 작품 전반에서 최북 특유의 필치보다는 태점(苔點: 산이나 바위, 땅의 묘사나 나물 줄기에 난 이끼를 나타낼 때 쓰는 작은 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소 정형화된 느낌을 준다.1932년 10월 조선미술관 주최로 열린 제1회 조선고서화진장품전람회에 함석태는 허련의 산거도를 출품했는데 이 작품은 평양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산골살이‘로 추정된다(Fig. 11). 산거도의 다소 거친 듯한 붓질로 표현된 나지막한 산들과 스산한 느낌의 피마준, 산 정상 언저리의 태점, 울타리 주변의 직선으로 올라온 침엽수 표현 등은 허련의 그림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화제는 “(신해년(1851) 가을 수헌 선생님 보아주십시오, 소치 올림(辛亥秋 睡軒先生 疋鑒 小癡宗下)“로 되어 있는데, 커다란 두 그루 소나무 밑의 초가에서 화병을 들고 오는 동자를 바라보는 인물이 제목 그대로 산속에서 은거하며 사는 수헌 선생으로 여겨진다. 허련의 그림은 대체로 까슬하고 소방한 필치로 된 것이 많은데 산거도는 어른께 드리는 그림이어서 인지 붓놀림이 단정하다.1938년 11월 8일에서 12일까지 오봉빈의 조선미술관이 주최하고 매일신보사 후원으로 경성 부민관에서 열린 대규모 서화 전람회 조선명보전람회에 함석태는 6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그 가운데 최북, 권돈인, 김수철의 작품은 1934년의 조선중국명작고서화전람회에 출품된 것과 같은 작품으로 추정된다[16]. 정리하자면 함석태가 서장했던 고미술품 가운데 북한 문화재를 수록한 도록의 사진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은 표3에 있는 것처럼 8점이다(Fig. 12).함석태는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의사라는 명예로운 기록 외에 ‘소물진품대왕’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많은 고미술품을 소장한 일제강점기 굴지의 고미술품 소장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일제강점기 말인 1944년 9월 또는 10월경 함석태는 일제의 소개령에 따라 자신의 소장품을 모두 세 대의 차에 나눠 싣고 고향인 평안북도 영변으로 가서 해방을 맞이했다. 그 후 황해도 해주를 거쳐 월남하려다 실패한 이후 함석태의 소식은 알 수 없다. 아마도 해주에서 배를 이용하여 고미술품을 가져오려다 실패한 듯하다.함석태가 수집한 많은 미술품 가운데 사진으로나마 전해지는 것은 조선고적도보 15권, 조선시대 도자편의 15점, 조선명보전람회도록과 평양 조선미술관 소장 9점인데,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도자기 15점, 회화 4점에 불과하다. 근현대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수장가들의 소장품들이 그 소재조차 알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은데 함석태의 소장품 역시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많은 수효는 아니지만 현재 전해오는 그의 소장품만으로도 함석태의 뛰어난 감식안, 심미안은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소품, 진기한 모양의 고미술품에 매료되었던 그의 성향과 기질을 확인할 수 있다. 함석태야말로 경제적 타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혼을 기울여 고미술품을 수집한 수장인의 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을 듯하다.
- NOTES
- NOTES
- REFERENCES
- REFERENCES
- 1. 치과임상 편집부 :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 함석태, 치과임상 6월호, 1985.2. 함석태 : 구강위생 긴급한 요건, Dong-A Ilbo, 1924.02.11.3. 안도산의 입치, 잡지 동광 제36호, 1932.4. 3명은 병중 신음, Dong-A Ilbo, 1927.09.10.6. 함석태 : 공예미, 문장사 제1권, 제8호, 1939.7. 이태준 : 도변야화, 춘추 제3권 제8호, 1942.8. 박병래 : 도자여적, 중앙일보사, 1974.9. 오봉빈 : 서화골동의 수장가, Dong-A Ilbo, 1940.05.01.10. 손진태 : 문예-민예수록, 삼천리 제7권 제7호, 1935.11. 도판해설, 북녘의 문화유산, 국립중앙박물관, 2006.12. 도판해설,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편,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조선시대편, III 도자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13. 성황이 기대되는 고서화진장품전, Dong-A Ilbo, 1930.10.10.14. 고서화진장품전 명조 10시 개장, Dong-A Ilbo, 1930.10.01.15. 김용준 : 근원수필, 을서문화사, 1948.16. 역대고서화의 정수 조선명보전람회, Maeil Sinbo, 1938.11.05.